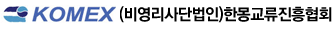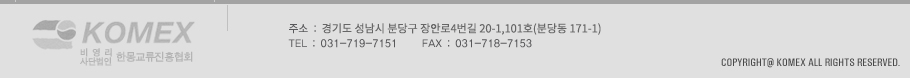| 제목 : 몽골에서 손가락질의 의미 |
|
| 작성자 : 관리자 |
2010.12.27 15:23:44, 조회 1,780 |
|
|
몽골에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검지만 펴서 흔들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둘이서 싸움을 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제3자에게 손가락질하다가 그 사람한테 걸리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른들이 '너 다시 그렇게 하기 만 해 봐!' 라는 약간의 협박의 의미를 포함시켜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수준인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을 했을 경우 자기보다 낮추는 무시하는 의미, 언젠가 한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협박의 의미로 전해진다. 몽골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원래 유목민들이 몸짓언어를 많이 안 쓰는 본질과 관련이 있다.
몽골의 자연숭배 사상
몽골에서 자연현상, 산, 강 등을 손으로 가르킬 때 한 손가락으로 가르키지 않는다. 꼭 다섯 손가락을 편 상태로 가르킨다. 그것은 바로 몽골 사람들의 자연을 숭배하는 풍습이다. 몽골에서 어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떠난 사람과 어르신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존경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마찬가지로 산이나 강 옆에서 그 산과 강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
|
|
|
<TABLE border=1 borderColorDark=white cssquery_uid="227">
<TBODY>
<TR>
<TD width=643>
<P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4280c0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12pt"><B>[3] </B></SPAN></FONT><FONT size=2 face=굴림체> <BR> 극히 일부의 연구성과를 제외하면, 한.몽 민속의 비교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실제로 거의 없다. 또한 양자의 비교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라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 기본적인 접근 태도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한국에서 몽골학이 시작된 최근 10여년 동안은 대개의 경우 한.몽 문화에 대한 일정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속에서 몽골 기행(紀行)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한국 민속과 직.간접적으로 비슷한 형태와 내용이 찾아지면, 단편적으로 유사성을 지적하고, 그 유사성에 한국 민속의 원류(또는 '뿌리'라고 표현도 되는)나 교류 관계가 찾아졌다고 판단했다.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비교 연구로서 유사성 찾기에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진력했기 때문에</FONT><FONT size=2 face=굴림체>, 양자의 차이점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것 같다. 아무리 사물은 보고자하는대로 존재한다지만, 찾고 싶은 유사성만 보일 뿐 다른 점은 애초에 관심도 없어 보였다. 이런 점에서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한.몽 민속의 비교연구는 유사성에만 집중된 잘못된 것이었다</FONT><FONT size=2 face=굴림체>.</FONT><FONT face=굴림체> </FONT></P>
24 Lines more... (total : 29lines) |
<P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4280c0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12pt"><B>[2]<BR> </B></SPAN></FONT><FONT size=2 face=굴림체>이상과 같은 학문 과정을 통하여 지적되어 온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한.몽 민속의 대표적 유사성</FONT><FONT size=2 face=굴림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FONT><FONT face=굴림체> </FONT></P>
<P style="LINE-HEIGHT: 150%"><FONT size=2 face=굴림체>몽골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샤마니즘과 무속</FONT><FONT size=2 face=굴림체>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오보와 서낭당</FONT><FONT size=2 face=굴림체>(때로는 성황당이라고도 표기),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훈촐로와 돌하루방</FONT><FONT size=2 face=굴림체>(주채역,1992.), 샤만 후보자의 나무인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솔로모드와 솟대</FONT><FONT size=2 face=굴림체>(色音,1991.322.), 한국의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장승과</FONT><FONT size=2 face=굴림체> 내몽골 촌락의 수호신 고목(古木)인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샹싱</FONT><FONT size=2 face=굴림체>(색음, 1991,310.),칭기스칸의 10대조인 보포차르의 어머니가 빛을 받아 세 아들을 낳았다는</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 신화</FONT><FONT size=2 face=굴림체>와 부여.고구려의 동명.주몽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신화</FONT><FONT size=2 face=굴림체>, 몽골과 한국이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설화에서 보이는 유사성</FONT><FONT size=2 face=굴림체>, 곧 '사구국(沙丘國)'과 '나무꾼과 선녀'.'황금매'와 '흥부와 놀부'.'여우와 토끼'와 '범과 토끼'등에서 보이는 모티브(주채혁, 1984,10-11.), 또한 '미하친 이야기'와'여우누이', '우루(雨漏)의 무서움'과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쥐의 지혜'와 '까치의 보은(報恩)'(최인학, 1997.)(한.몽간의 설화 교류에 대해서는 일찍이 손진태도 지적한 바 있다. 손진태,1947.참조),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장치기. 실뜨기.고누. 공기놀이.자치기.굴렁쇠 굴리기, 가위.바위.보.씨름</FONT><FONT size=2 face=굴림체>, 몽골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신선로</FONT><FONT size=2 face=굴림체>, 몽골 여인네들이 즐겨 쓰는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머리 수건,</FONT><FONT size=2 face=굴림체> 음식 먹기 전에 귀신에게 먼저 바치는 의례인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고수레</FONT><FONT size=2 face=굴림체>, 신부의 머리장식인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도투락 댕기, 돌잡이, 신방엿보기, 신랑다루기</FONT><FONT size=2 face=굴림체>, 시어머니가 도끼를 신부 옷에 채워주는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풍속</FONT><FONT size=2 face=굴림체>, 재래식 바느질 도구의 하나인</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 인두</FONT><FONT size=2 face=굴림체>,</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 매사냥, '아르히'와 '소주(燒酒)</FONT><FONT size=2 face=굴림체>',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흰색 숭배, 설렁탕과 슐</FONT><FONT size=2 face=굴림체>(몽골어로 국이나 탕의 뜻), 제주도 가옥에서 대문 구실을 하는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정낭</FONT><FONT size=2 face=굴림체>과 몽골의</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 셔낭</FONT><FONT size=2 face=굴림체>,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고탈</FONT><FONT size=2 face=굴림체>이란 가죽 신발과 고구려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가죽 신발</FONT><FONT size=2 face=굴림체>(김광언,1993.),신부 치장에 있어서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연지</FONT><FONT size=2 face=굴림체>, 몽골어에서 유래된 낱말인 연지와 단군(檀君)(김기선,1995.),몽골어의 쌍갈래 길에서 손바닥에 침을 뱉어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갈길 정하기</FONT><FONT size=2 face=굴림체>(최기호,1995.299.),몽골과 고구려가 모두 활</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쏘기, 말타기,씨름</FONT><FONT size=2 face=굴림체>을 즐기는 사실 등이 한.몽 민속의 비교에서 보이는 유사성이라고 일컬어져 왔다.</FONT><FONT face=굴림체> </FONT></P>
<P style="LINE-HEIGHT: 150%"><FONT size=2 face=굴림체>한편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머리에 새깃을 꽂는</FONT><FONT size=2 face=굴림체> 고구려와 백제의 풍속은 몽골과 같은 유형에 속하고, 변한과 진한에서 죽은 사람을 새의 큰 깃에 실어 보냈다는 것은 영혼의 하늘 운반을 기대하는 티베트에 있어서의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조장(鳥葬</FONT><FONT size=2 face=굴림체>)과 같은 우주관에 의한 것임을 알수 있다."(임동권, 1992.194.)고 하고, 이어서"이번 영해에 있어서 하나의 수확은 우리 민족으 조장(鳥葬) 풍속과 꿩의 깃이 두드러진 것은 우리의 민속과 관련시킬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이 북쪽에서 남으로 이동해 왔다고 하는데 북에 있었던 조오(鳥羽)민소, 특히 꿩의 풍속도 민족이동과 함께 전파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꿩 민속의 원류를 만주나 몽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임동권, 1992.195-8.)라고 하여,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조에 보이는 '-以大鳥羽送死其意慾使死者飛揚-'과 머리의 새깃 장식, 꿩 민속의 기원을 몽골에서 찾았다.</FONT><FONT face=굴림체> </FONT></P>
<P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오보와 오보</FONT><FONT size=2 face=굴림체>제와 관련해서도,"(그것이) 한국의 돌탑, 달집, 대동굿과 매우 유사한 면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돌탑과 제의는 몽골의 오보와 오보제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티우는 달집은 그 형태가 몽골의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보르가슨 오보</FONT><FONT size=2 face=굴림체>나 흉노의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용성(龍城)</FONT><FONT size=2 face=굴림체>을 유추시키게 한다. 또 참가자들이 제물을 가지고와 신의 축복을 받은 뒤 연회를 베푸는 오보제는 한국의 대동굿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졌다."(박원길,1998.145.)고 하고, "특히 몽골군이 주둔했던 제주도의 돌탑은 몽골의 오보와 같이 돌탑의 꼭대기에 나무를 꽂는 구조적인 일치까지 보이고 있다"(박원길,1998.95.)고 하여, 오보가 한국의 마을신앙과 두루 연계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FONT><FONT face=굴림체> </FONT></P>
<P style="LINE-HEIGHT: 150%"><FONT size=2 face=굴림체>또한 </FONT><FONT color=teal size=2 face=굴림체>체형(體形) 및 인성(人性)</FONT><FONT size=2 face=굴림체>에 있어서도 한.몽 사이에는 매우 친연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곧 "몽골 노인이 피워 문 곰방대와 주름진 얼굴에서 한국인의 정감을 느낄수 있다."(조선일보사, 1993.화보.)든지,"표적을 겨눈 노인의 진지한 표정이 마치 우리 할아버지처럼 정겹다"(최서면,1990.화보.)든지 하는 표현을 흔히 접할 수 있다.</FONT><FONT face=굴림체> </FONT></P>
6 Lines more... (total : 11lines) |
<P style="LINE-HEIGHT: 15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color=#4177ae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SPAN></FONT><FONT color=gray size=2 face=굴림체>아래에 기록된 글은</FONT><FONT color=#4177ae size=2 face=굴림체> 漢南大學校 이필영 교수</FONT><FONT color=gray size=2 face=굴림체>의 글입니다.</FONT></P>
<DL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left>
<DT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4177ae size=2 face=굴림체><B>"초원의 대서사시 - 몽골 유목문화"</B></FONT><FONT color=#4177ae size=2 face="Arial Narrow"> (</FONT><FONT color=#4177ae size=2 face=Arial>The legacy of the steppe - Mongolian ,nomadic culture)</FONT>
<HR style="LINE-HEIGHT: 160%" color=#e0e8e0 SIZE=5 noShade>
17 Lines more... (total : 22lines) |
<P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teal face=굴림체><B><SPAN style="FONT-SIZE: 11pt">" 투르크와 몽골족 중심고찰 "<BR></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B></FONT></P>
<HR style="LINE-HEIGHT: 160%" color=#e0e8e0 SIZE=5 noShade>
<P style="LINE-HEIGHT: 150%"><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 </SPAN></FONT><FONT color=#4280c0 face=굴림체><B><SPAN style="FONT-SIZE: 12pt"> </SPAN></B></FONT><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 <IMG border=0 hspace=5 vspace=5 align=left src="http://www.mongolschool.com/mongol/images/m-m-d.gif" width=285 height=192></SPAN></FONT><FONT color=gray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현재 </SPAN><B><SPAN style="FONT-SIZE: 10pt">몽골(Mongol)</SPAN></B><SPAN style="FONT-SIZE: 10pt">이라 불리는 사람들(이하 몽골족이라 부른다)의 거주지역은 국경에 의해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각각 러시아연방의 </SPAN></FONT><FONT color=#5070a0 face=굴림체><B><SPAN style="FONT-SIZE: 10pt">부리야트 공화국</SPAN></B></FONT><FONT color=gray face=굴림체><B><SPAN style="FONT-SIZE: 10pt">,</SPAN></B><SPAN style="FONT-SIZE: 10pt"> 독립국인 </SPAN></FONT><FONT color=#5070a0 face=굴림체><B><SPAN style="FONT-SIZE: 10pt">몽골국</SPAN></B></FONT><FONT color=gray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 (흔히 외몽골이라 부른다), 중화 인민공화국의 </SPAN></FONT><FONT color=#5070a0 face=굴림체><B><SPAN style="FONT-SIZE: 10pt">내몽고자치구</SPAN></B></FONT><FONT color=gray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흔히 내몽골이라 불린다) 이다.</SPAN></FONT></P>
<P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gray size=2 face=굴림체>몽골족은 이밖에도 러시아령 칼묵 공화국, 중국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청해성 등지에 분산 거주하고 있다.</FONT><FONT color=gray face=굴림체> </FONT></P>
18 Lines more... (total : 23lines) |
<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4177ae> </FONT></SPAN><FONT color=gray size=2>몽골초원의 목축 대상은 몽골어로 <말>이라 일컬어지는 </FONT><FONT color=#4177ae size=2>말,양,염소,소(야크포함),낙타</FONT></FONT><FONT color=gray size=2 face=굴림체> 등 5종의 가축이다.<IMG border=0 align=right src="http://www.mongolschool.com/mongol/images/GFriends_small.jpg" width=100 height=76> 이 5종 가축이 몽골 유목경제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데, 새끼를 볼모로 하는 젖짜기,번식을 관리하는 불까기,가축을 관리하는 목축기술등은 유목민족인 몽골족에겐 생존수단이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가축에서 획득한 젖을 원료로 만들어낸 술(마유주)은 제의나 의례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음식이 된다. <BR></FONT>
<HR style="LINE-HEIGHT: 160%" color=#e0e8e0 SIZE=5 noShade>
<P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4177ae size=3 face=굴림체><B>1. 목축 이야기 <BR></B></FONT><FONT color=#ff9900 size=3 face=굴림체><B><IMG border=0 align=left src="http://www.mongolschool.com/mongol/images/horse4.gif" width=81 height=55><BR></B></FONT><FONT color=gray size=2 face=굴림체>보통 종마 1마리가 거느리는 말은 20~40마리가 한 떼를 이루고 있다. <BR>예나 지금이나 유목가구 1세대는 보통 종마 1마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말떼가 있다.<BR>몽골 초원에서는 보통 젖짜기,불까기,낙인찍기,승용마 고르기 등 필요한 때 외에는 말떼를 방목하여 키운다.<BR><BR> 종마는 무리를 거느리고 이리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말 무리를 지킨다. 낙타도 말과 같이 종자가 되는 낙타가 무리를 통솔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특별히 낙타치기를 두지 않고 물건을 운반할 때 등 필요한 때만 인력을 데리고 온다. <BR><BR> 그러나 고비지역 등 물마실 데가 우물밖에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매일 물을 퍼올려 가축에게 물을 먹여야 한다. 낙타떼는 매일 물을 마시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마실 물을 운송할 겸 며칠에 한 번씩 우물로 데리고 간다. 낙타나 말 떼는 보통 집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비해,소 떼나 양과 염소의 혼성무리는 밤에 주인 게르 바로 가까이에서 잔다. 이무리는 아침에 방목하러 나갔다가 저녁엔 게르 부근으로 되돌아 오는 순환을 반복하는데, 소떼는 사람이 특별히 돌볼 필요가 없지만 양떼는 반드시 사람이 돌보아야 한다. <BR><BR> 양떼는 수백마리 단위로 큰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종자가 되는 양이 무리에 대한 구심력을 가지고 잇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리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이리에게 잡아 먹히기도 한다. 그래서 양떼에 약 25% 정도로 염소를 섞는다. 염소는 호기심이 강하고 스스로 영양가 있는 풀을 찾아내거나 위험을 피할 수도 있다. <BR><BR> 유목민은 목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지형,풀의 식생,물마실 곳의 위치,그날의 날씨,특히 풍향을 고려하여 양,염소떼의 하루 방목코스를 결정한다. 그 계획에 따라 하루에 몇 번씩 무리의 이동방향을 바꾼다. 목동은 가끔 집에 돌아가 차를 마시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말이나 낙타떼는 스스로 풀을 뜯어 먹도록 놓아 두지만,그렇다고 주인이 가축떼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능력있는 유목민은 지형,기후,특히 풍향,풀의 식생,물먹이는 장소등을 머리에 넣어 시뮬레이션하면 자신의 말이나 낙타가 지금 어디에 있고,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거의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BR><BR> 가축이 없어졌을 때 남자들은 즉시 가축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남자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가축을 찾는 일이다. 가축을 찾아나선 길에 머물게 되는 집에서는 식사 와 침구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의다. 이때 남자들은 누구네 집 말 떼가 어디에 있다는 등 가축 떼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교환하게 되는데, 가축을 통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있다.</FONT></P>
<HR style="LINE-HEIGHT: 160%" color=#e0e8e0 SIZE=5 noShade>
8 Lines more... (total : 13lines) |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language: KO" lang=EN-US><FONT face=돋움><?XML:NAMESPACE PREFIX = O /><O:P><STRONG><FONT color=#0033ff>종교</FONT></STRONG> </O:P></FONT></SPAN></P>
<P style="MARGIN-LEFT: 11pt"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language: KO"><FONT color=#333333 face=돋움>몽골의 종교 현황은 샤머니즘</FONT></SPAN><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333333 face=돋움>/정령 숭배가 약 50%, 라마불교가 26%,회교 약 4%,기독교 약 0.03%~0.11%정도이다. 현재 울란바타르에 39개, 지방에 39개의 교회가 있으며 그 중 3곳은 외국인 교회 (인터내셔널 교회, 한인 교회, 중국인교회 ) 이다. 기독교 신자는 어린이 를 포함하여 7,44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16세 미만의 어린이 비율 이 36%이다<O:P></O:P></FONT></SPAN></P>
<P style="MARGIN-LEFT: 11pt"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language: KO" lang=EN-US><FONT color=#333333 face=돋움><O:P> </O:P></FONT></SPAN></P>
<P style="TEXT-INDENT: 11pt"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language: KO" lang=EN-US><FONT color=#0033ff face=돋움><B>1)샤머니즘</B></FONT><FONT face=돋움><O:P></O:P></FONT></SPAN></P>
<P style="MARGIN-LEFT: 22pt"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language: KO"><FONT color=#333333 face=돋움>몽골은 샤머니즘이 번성한 지역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FONT></SPAN><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333333 face=돋움>. 중앙 아시아 의 혹독한 생활 환경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샤머니즘에 젖게 만들었으며 다양한 종교적 심성도 샤머니즘에 녹아 들었다. <BR>샤머니즘은 몽골 역사 초기부터 13세기 혹은 16세기까지 몽 골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종교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늘날 까지도 샤머니즘은 몽골인의 심성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생활 곳곳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BR>샤머니즘은 칭키스칸 시절 즉 초기 몽골 제국 시절에는 국가 무당이 전쟁에 관하여 충고함으로써 막강한 세력을 발휘하였고 국가 종교로 인정되었다.<BR>칭키스칸은 "우리 몽골인들은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는 유일신이 존재 한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한바 있다. 하나의 강력한 최고의 신개념 은 유라시아 초원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사고였다. 몽골인들은 텡게르(TENGER)라는 유일신을 믿었다. 텡게르 (TENGER) 라는 개념은 '하늘 의 신','하늘의 힘센 지도자'라는 뜻이다.. <BR>무속의 다른 기초 기능들에는 예언, 점, 그리고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 을 찾는 것이었다. 무당들은 춤과 노래 그리고 심지어 마약의 사용 등을 통해 황홀경에 빠져든다. 어떤 이들은 의식에 앞서 굶기도 한다.<BR>지금도 어느 곳을 가든지 '어버'라고 하는 성황당 같은 것이 널려져 있다. 여전히 무당들이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하다. 젊 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도시에서 점술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O:P></O:P></FONT></SPAN></P>
8 Lines more... (total : 13lines) |
<DIV id=articles>몽골 전통 가옥을 '겔'이라고 한다. 유목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가옥이 바로 이 겔이다. 겔은 동그랗게 생겼으며 지름이의 길이가 8미터 정도 된다. 겔의 문은 항상 남쪽을 향해야 한다. 겔 내부의 복쪽 부분에는 불상, 금고, 책 등 소중한 것들이 있다. 들어가서 왼쪽 편은 남성의 자리라고 해도 된다. 그 집안 남성의 침대. 말안장, 고삐 등 가축을 키우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 들어가서 오른쪽 편은 그 집 주부의 자리다. 밥과 유제품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겔문 오른쪽 편에서만 볼 수 잇다. <BR><BR>유목민 집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2-3마리 키운다. 손님이 남의 집을 처음 방문하면 말에서 내리기 전에 개가 있건, 없건 '개 잡아 주세요"라고 부르고 겔안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사람이 나와 개를 잡아 주고 난 다음이 손님 겔에 들어간다. <BR><BR>손님들이 들어가서 남성이 있는 자리로 겔문 왼쪽 편으로 가야 된다. 겔 가운데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집주인보다 어린 손님들은 그 기둥을 지나가지 않는다. 손님이 왼쪽 편으로 들어와서 오른발 바닥을 땅에 밟은 채로 정강이 부분을 세워서 무릎을 접고, 왼쪽을 다리를 무릎으로 접에서 정강이를 눕혀서 발이 오른쪽 무릎 밑으로 오도록 해서 앉는다. 겔의 정북에 가서 앉으면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 된다. <BR><BR>들어온 손님한테 차를 따라 주고, 유제품, 빵 등 있는 것을 대접 해야 한다. 집 주부가 따라 준 차를 손님 두 손으로 받아서 대접해 놓은 유제품, 빵 등을 맛보아야 한다. 만약에 손님이 멀리서 온 사람이면 밥을 해 주는 것이 예의적이다. 그런데 '밥을 해 줄까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손님이 밥을 먹기 싫으면 그 집 주부의 행동을 보고 밥을 하기 전에 말린다.<!--"<--></A><XMP>출처 : 칭기스여행사</XMP></DIV>
|
<DIV id=articles>몽골에서 술을 마실 때 어른이 먼저 따라 주거나, 어른한테 임명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술을 따라 준다. 모든 사람의 잔을 채운 다음에 제일 어른이 되는 분이 덕담을 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실 수 있다. 몽골사람들이 누구나 술을 먹을 때 검지 손가락을 잔에 있는 술에 살짝 찍어서 하늘로 세 번 뿌린다. <BR><BR>몽골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우유 차(수태차)를 즐겨 먹는다. 그래서 집집마다 매일 아침에 우유 차를 끓인다. 우유 차를 끓이고 나서 위에 만들어진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은 잔에다가 분리시키고 그것을 산, 하늘, 태양, 칠성에다 소원을 빌면서 뿌리는 풍습이 있다. 이 행동을 몽골어로 '제사를 바친다'라고 하며, 제사를 바치는데 쓰는 잔, 숟가락 등을 밥 먹는 일반 잔과 수저와 달리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BR><BR>옛날에 몽골 사회에서 술은 큰 어른들만 마시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유 차의 윗부분처럼 여겼던 것이다. <BR>몽골에 술과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BR>"40살 먹어서 맛봐라, 50살 먹어서는 조심하게 먹어라, 60살 먹어서야 편안하게 마셔라<!--"<--></A><XMP></XMP></DIV>
|
<DIV id=articles>몽골에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검지만 펴서 흔들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둘이서 싸움을 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제3자에게 손가락질하다가 그 사람한테 걸리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BR><BR>어린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른들이 '너 다시 그렇게 하기 만 해 봐!' 라는 약간의 협박의 의미를 포함시켜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수준인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을 했을 경우 자기보다 낮추는 무시하는 의미, 언젠가 한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협박의 의미로 전해진다. 몽골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원래 유목민들이 몸짓언어를 많이 안 쓰는 본질과 관련이 있다. <BR><BR><STRONG>몽골의 자연숭배 사상</STRONG><BR>몽골에서 자연현상, 산, 강 등을 손으로 가르킬 때 한 손가락으로 가르키지 않는다. 꼭 다섯 손가락을 편 상태로 가르킨다. 그것은 바로 몽골 사람들의 자연을 숭배하는 풍습이다. 몽골에서 어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떠난 사람과 어르신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존경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마찬가지로 산이나 강 옆에서 그 산과 강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A><XMP></XMP></DIV>
|
<IMG border=0 alt="" src="http://data.ygosu.com/editor/attach/20101211/Hlc7ieLRumW9.jpg" width=636 height=427><BR><BR>
<P></P><BR>
<P styte-="TEXT-ALIGN: center"><SPAN styte-="FONT-FAMILY: Dotum"><SPAN styte-="FONT-SIZE: 11pt"><FONT color=#c00000><B>1206년, 징기즈칸 몽골 통일 <BR><BR></B></FONT></SPAN></SPAN></P><BR>
<P styte-="TEXT-ALIGN: center"><SPAN styte-="FONT-FAMILY: Dotum"><SPAN styte-="FONT-SIZE: 11pt"><FONT color=#c00000><B>인구 100만<SPAN class=space></SPAN>명의 변방국가</B></FONT></SPAN></SPAN></P><BR>
<P align=center styte-="MARGIN: 5px 0px"> <BR><FONT size=2><BR></FONT><IMG border=0 alt="" src="http://data.ygosu.com/editor/attach/20101211/PVS1Lv4K28gCF8u6N.jpg" width=636 height=826><BR></P><BR>
24 Lines more... (total : 29lines) |
<P class=MsoPlainText><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몽골의 사법제도</SPAN></SPAN></P>
<P class=MsoPlainText><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P>
<P class=MsoPlainTex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1</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FAMILY: Gulim">. </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헌법재판소</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Үндсэн хуулийн цэц</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헌법재판소는 몽골 신헌법</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ШИНЭ ҮНДСЭН ХУУЛЬ</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의 제정에 따라 최초로 규정 되었으며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신헌법 제</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5장 헌법재판소 제64조~제67조에 규정되어 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몽골의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헌법상 최고의 기관으로서 몽골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심사하는 판사의 구성은 총</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9인으로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에서 3인을 추천하여 국회의 동의에 따라 6년 임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SPAN></SPAN></P>
<P class=MsoPlainText><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P>
<P class=MsoPlainText><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2. 법원</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 style="FONT-FAMILY: Gulim">Шүүх</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BR></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1) 사법권</SPAN></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Mon; mso-hansi-font-family: Arial Mon;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Mon; FONT-SIZE: 8pt; mso-hansi-font-family: Arial Mon;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ĪЪÂ.</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د¯Õ ÝÐÕ ÌÝÄÝË</SPAN></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Mon; mso-hansi-font-family: Arial Mon;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의 독립</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몽골 신헌법(ШИНЭ ҮНДСЭН ХУУЛЬ</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에서는 제</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3장 국가기관, 제4절 사법권,</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 제</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49조 제2항에서“대통령, 총리, 국회, 국무위원,정부, 정당,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원, 국민 누구든지 판사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SPAN style="FONT-FAMILY: Gulim">Ерөнхийлөгч, ерөнхий сайд,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ба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гишүүн, төр, нам, олон нийтийн бусад байгууллагын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 иргэн хэн боловч шүүгчээс шүүн таслах үүргээ хэрэгжүүлэхэд хөндлөнгөөс оролцож болохгүй</SPAN></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mso-hansi-font-family: Arial;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고 규정하여</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BR></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2) 사법 구조</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대법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Улсын дээд ш</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mso-ascii-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FAMILY: Gulim">үү</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Narrow; mso-ascii-font-family: Arial Narrow"><SPAN style="FONT-FAMILY: Gulim">х</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 지방법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Орон нутгийн ш</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mso-ascii-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FAMILY: Gulim">үү</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Narrow; mso-ascii-font-family: Arial Narrow"><SPAN style="FONT-FAMILY: Gulim">х</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 솜</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법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Сум дундын ш</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mso-ascii-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FAMILY: Gulim">үү</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Narrow; mso-ascii-font-family: Arial Narrow"><SPAN style="FONT-FAMILY: Gulim">х</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 및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BR></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3) 법원의 구성</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담당 별로 민사부(Иргэний хэргийн тасаг</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 형사부</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Эрүүгийн хэргийн тасаг</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 행정부</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Захиргааны хэргийн тасаг</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로 소송절차</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Давж заалдах шат дамжлага)</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 별로 제</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1심 법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Gulim">Анхан шатны шүүх</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제2심 법원(고등법원,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 style="FONT-FAMILY: Gulim">давж</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Gulim">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 style="FONT-FAMILY: Gulim">заалдах</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Gulim">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 style="FONT-FAMILY: Gulim">шатны</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Gulim">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 style="FONT-FAMILY: Gulim">ш</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Arial; mso-ascii-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FAMILY: Gulim">үү</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Arial Narrow; mso-ascii-font-family: Arial Narrow"><SPAN style="FONT-FAMILY: Gulim">х</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대법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Улсын дээд ш</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mso-ascii-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FAMILY: Gulim">үү</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Arial Narrow; mso-ascii-font-family: Arial Narrow"><SPAN style="FONT-FAMILY: Gulim">х</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으로 나누어져 있다.<BR></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4) 대법원 판사</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Улсын дээд шүүхийн шүүгч</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및 법원 판사는 신헌법 제</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49조 제3항 규정의 법원위원회(Шүхийн ерөнхий</SPAN></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mso-hansi-font-family: Arial;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에 따라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Gulim">대통령이 임명한다</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P>
4 Lines more... (total : 9lines) |
<TABLE class=__se_tbl_review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_type="review" s_subtype="default">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 WIDTH: 832px; FONT-FAMILY: dotum; HEIGHT: 32px; COLOR: #f21c1c; FONT-SIZE: 15pt; VERTICAL-ALIGN: top; PADDING-TOP: 10px" class=se2_editarea colSpan=2><FONT size=2 face=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dotumche; COLOR: red; FONT-SIZE: 14p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style="FONT-SIZE: 12pt" lang=EN-US><FONT size=2><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바탕체, batangche; COLOR: #000000; FONT-SIZE: 12pt">
<P align=center><SPAN lang=EN-US><?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FONT color=#636363 size=2 face=바탕><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dotumche;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dotumche; COLOR: red; FONT-SIZE: 14pt"><STRONG><SPAN style="FONT-FAMILY: 바탕, batang">몽골의 결혼 풍습</SPAN></STRONG></SPAN></SPAN></SPAN></SPAN></SPAN></FONT></o:p></SPAN></P></SPAN></STRONG></FONT></SPAN></FONT></FONT></SPAN></SPAN></SPAN></FONT></TD></TR></TBODY></TABLE>
33 Lines more... (total : 38lines) |
연대표
<UL class=style3>
<LI><SPAN lang=EN-US xml:lang="EN-US">BC 3~1세기- 첫 번째 몽골 제국 Khunnu</SPAN>
<LI><SPAN lang=EN-US xml:lang="EN-US">BC 1세기~AD 320- 두 번째 몽골 제국 Syanbi</SPAN>
<LI><SPAN lang=EN-US xml:lang="EN-US">AD 330~402- 세 번째 몽골 제국 Nirun</SPAN>
70 Lines more... (total : 75lines) |
<TABLE border=0 cellSpacing=0 borderColor=#ffffff cellPadding=0 width=580 bgColor=#ffffff>
<TBODY>
<TR>
<TD class=style3>
<P class=style3>몽골의 화폐</P></TD></TR>
7 Lines more... (total : 12lines) |
<BR>
<DIV style="BACKGROUND-IMAGE: none;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40%;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POSITION: center top; FONT-SIZE: 10p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6 Lines more... (total : 11lines) |
<P>20세기 근현대사 중 '사회주의 시대의 몽골'('바바르의 몽골의 역사' 중)<BR><BR>몽골의 근현대사에 대한 기록중 '바바르'란 분에 대해 아시나요?</P>
<P>바바르는 저명한 언론인이며 40여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민주당계열 주요일간지인 으뜨링서닝의 공식 집필자이며, 매년 그가 쓴 칼럼을 묶어 "바바르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P>
<P>국제관계학, 정치학, 경제학, 기타 각종 사회과학 대학원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 불립니다.</P>
<P>90년대 민주화 운동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그가 집필한 "20세기 몽골역사"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간되었고, 세계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없지요.</P>
<P>그 중 그의 몽골사를 축약해서 만든 몽골의 역사가 컬러판으로 나온 걸을 몽골국립대학 베. 돌마(한국학과 교수), 그리고 제 학문적 벗이자 몽골학의 거두가 되어 가고 있는 한정탁(역사학과 석사생)이 공동 번역한 내용중 일부를 소개하려 합니다.</P>
53 Lines more... (total : 58lines)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76>
<TBODY>
<TR>
<TD bgColor=white vAlign=top width=581>
<TABLE border=0 cellSpacing=0 borderColor=#ffffff cellPadding=0 width=580 bgColor=#ffffff>
86 Lines more... (total : 91lines)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TBODY>
<TR>
<TD rowSpan=15 width=30></TD>
<TD class=style3 width=528>
163 Lines more... (total : 168lines)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TBODY>
<TR>
<TD width=30></TD>
<TD width=528>
205 Lines more... (total : 210lines)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8>
<TBODY>
<TR>
<TD>
<P>▶ 주거</P></TD></TR>
204 Lines more... (total : 209lines) |
|